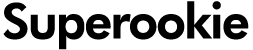2020년 여름쯤 ‘1년 100권 읽기'를 목표로 한창 독서에 집중했다.
출근 전 새벽, 회사에서 점심시간, 퇴근 후 저녁시간, 그리고 주말 할 것 없이 틈만 나면 책을 읽으려 노력했다. 그런데 집에서 읽는 책과 회사에서 읽는 책이 달랐다. 집에서는 재테크나 자기 계발서를 주로 읽었고, 회사에서는 직무, 리더십과 관련된 책을 읽었다. 집과 회사에서 읽는 책을 가능하면 분리하려 했다. 집에서 일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 왠지 워라밸을 깨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여유 있게 책 읽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였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워라밸을 지키고 싶었다.
어느 순간 책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재테크 관련 책은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다. 가끔 읽기는 하지만 그렇게 자주 읽지는 않는다. 주로 읽는 재테크 관련 책은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워런 버핏의 이야기,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 레이 달리오의 원칙,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 같은 책들이다. 사실 이들은 재테크 책이지만 오랜 시간 투자와 기업 운영을 하는 원칙은 평범한 리더십, 조직문화 책들보다 깊이가 있다. 리더십과 조직문화에 대한 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 캐럴 드웩의 마인드셋, 짐 콜린스의 Good to Great 등의 책들은 리더와 조직 측면에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도 꼭 읽어야 하는 책들이다.
부끄럽게도 책을 구분 짓는 것이 어리석었음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집에서도 회사책을 '편하게' 읽기 시작했다.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이를 계기로 일과 삶의 경계가 흐려졌다. 집에서 마음 편히 직무와 관련된 책을 읽으며 정리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와 관련된 자료를 만들고 정리하기도 했다. 예전의 기준으로는 워라밸이 깨진 것이다.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한다.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를 쓴 김호 작가는 워라밸을 '남을 위해 내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활동(A) / 나를 위해 내 시간을 쓰는 활동(B) 사이의 균형'이라고 한다. 내 시간에 '남을 위한 일'이 많을수록 워라밸이 낮고, '나를 위한 일'이 많을수록 워라밸이 높다. '나를 위한 일'을 회사와 상관없는 일을 통해서 늘리는 것보다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 가운데 무엇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느껴지는지 찾아보자고 한다. 즉 회사에서 하는 일의 일부를 나를 위한 일로 바꾸는 것이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나 자신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워라밸이 높아질 수 있다. 지난여름 집에서 독서를 하던 중에 책의 경계를 없앤 것은 '회사를 위한 일이 나 자신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일과 삶을 구분 짓는 워라밸의 기준에서는 나빠졌다고 할 수 있지만, 내 삶이 나빠진 것은 아니었다. 워크 앤 라이프 하모니였다.
워라밸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결과를 본 적이 있다.
심리학자 제리 에델위치 연구팀은 재미있는 연구를 소개한다. '일과 삶이 잘 분리될수록 만족도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연구결과는 반대였다. ‘일은 그냥 일일뿐이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 즉 일과 삶을 분리시키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삶에 대해 무기력함을 느끼는 확률이 높다고 한다. 워라밸을 추구할수록 회사에서 만족감을 느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회사에서의 만족감이 떨어질 테니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또한 낮을 수밖에 없다.
집에서 이 글을 쓰면서도 깨닫는다. 이 또한 '나를 위한 시간'이면서, ‘조직을 위한 시간'이라는 걸.
방성환 작가님의 글 더보러가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