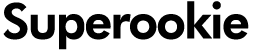형용사 '친절한'과 명사 '직장인'은 어쩐지 잘 붙지가 않습니다. '무표정한', '사무적인', '시니컬한' 등의 수식이 저를 포함한 직장인들에게 훨씬 잘 어울리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건 빡빡한 업무와 팍팍한 회사 생활 탓이겠고요.
그렇다고 친절한 직장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척하는 게 아니라 뼛속까지 친절한 직장인이 정말 존재합니다.
이들은 언제나 상냥하고 싹싹하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각박한 사무실 분위기를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지요.
하지만 직장인의 친절함은 때를 가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친절함'이 되어 버리거든요.
직장인 세계에서의 '나쁜 친절함'이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제가 할게요"
팀원 일을 대신 해주는 친절
모든 업무 분장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팀장은 업무를 나눌 때 팀 전체의 스케줄은 물론, 각 팀원의 역량과 일정, 컨디션을 모두 고려합니다.
특정한 의도를 갖고 업무 분장을 하기도 합니다. 가령 '이 일을 저 팀원에게 맡기면 어느 정도로 해낼 수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 일부러 업무를 주는 경우도 있죠.
일의 성과를 내는 것뿐 아니라 일을 어떻게 해나갈지 그 과정을 정하는 것도 팀장의 의무이자 권한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친절함으로 옆 팀원의 일을 대신하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살짝 돕는 수준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대신' 해주는 경우요.
첫 번째로, 이거 월권입니다. 앞서 말했듯 업무를 누가 할지 정하는 건 팀장 고유의 권한이니까요. 물론 본인 나름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옆 팀원이 너무 바빠 보여서, 내가 대신 해주길 바라는 거 같아서, 같은 팀이니까 아무나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등이요. 안 됩니다.
이중 그 어떤 것도 불가피한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라고 할 수 있는 건, 담당자가 부재중인데 너무너무 급하게 넘겨야 할 자료가 있을 때, 당장 누군가 처리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때 정도입니다.
이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도 팀장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둘째, 팀 문화를 망치는 민폐 행위입니다. 친절한 사람 주변에는 그 친절함을 이용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프리라이더형 인간들이 모여듭니다.
직장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골라 은근슬쩍 자기 일을 떠넘기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메일이나 품의서 작성, 자료 조사 같은 간단한 일을 부탁하지만 나중에는 ‘이왕 네가 하기 시작한 거 마무리까지 해라’ ‘저쪽에서는 너를 담당자로 알고 있으니 그냥 네가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좋겠다’ 식의 안하무인이 시전 됩니다.
나쁜 건 이상하게 전염성이 있습니다. 친절한 팀원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생길수록 팀의 건강은 위협받게 됩니다.
물론 더 나쁜 쪽은 프리라이더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결코 잘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해준 업무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은 더 복잡해집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다 보면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다가 본인이 덤터기를 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친절함 때문에 뒤통수 세게 맞을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협조를 구하지 않고
다른 팀 일을 대신 해주는 친절
회사라는 조직에는 각 팀마다 주어진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건 회사 구성원들 간의 약속이자 규칙입니다.
우리 팀에서 기획하거나 계획한 일이라고 해도, 다른 팀의 업무에 관여된다면 그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그들이 하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팀이 힘들고 귀찮아 할까 봐 친절히 직접 한다면? 나쁜 친절입니다. 회사의 정해진 조직체계와 공통의 약속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선례를 남김으로써 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케팅팀에서 기획한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파트너사에 공문을 작성해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문 작성과 발송은 원래 지원팀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마케팅팀 담당자가 공문 작성을 직접 해서 넘겼습니다. 지원팀이 바빠 보여 요청하기 미안했다는 이유입니다.
다음 시즌 마케팅팀의 다른 담당자가 공문 작성과 발송을 지원팀에 요청했더니, 지난번에 마케팅팀이 해줬으니 이번에도 직접 해주는 게 좋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부서별 업무 분장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기존에 없던 업무나 어떤 팀이 맡아야 할지 애매한 업무가 발생할 시에는 각 부서장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합니다.
한 명의 조직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업무 요청과 협조를 잘 구하는 것도 직장인이 마땅히 갖춰야 할 역량이자 자세임을 기억합시다.
"그럼 언제까지 될까요?"
일정을 마냥 배려해 주는 친절
모든 일에는 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고하는 일자가 될 수도 있고, 제품의 론칭, 서비스의 오픈데이가 될 수도 있지요. 일의 세부 일정은 그 마감으로부터 역순으로 계산해 정해집니다.
협조 부서나 협력사에 일정을 고지할 때에도 그걸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단번에 일정이 협의되지 않기도 합니다. 일이 진행되는 중간에 일정을 늦춰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일정만이 아니라 업무의 모든 과정은 '원활한 협상과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 입장만 내세워서도 안 되지요.
하지만 직장인에게 마감 기한이란, 해리포터 세계관에서의 '깨트릴 수 없는 맹세'와 같습니다. 어길 시 그 결과가 참혹하다는 뜻입니다.
마감 기한을 기준으로 너무 빠듯한 일정을 제시해 온다면 단박에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일정을 재조정할 시에는 본인이 곤란해지지 않을 적정한 마지노선을 두고 협의해야 합니다.
마냥 상대의 일정을 배려하지 맙시다. 상대의 시간을 지켜주느라 나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숨기는 친절
일을 하다 보면 상대에게 '이 시안은 안 돼요', '이 제안은 거절할게요' 등 'NO'를 말해야 하는 순간이 자주 옵니다.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고, 상대를 위해서도 그 이유를 사실대로 알리는 게 좋습니다.
제안사의 물품 단가가 너무 높다, 제안 내용이 회사가 제시한 방향이나 톤이 아니다, 제안사의 이력만으로는 해당 프로젝트를 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디자인의 합성 수준이 떨어져 퀄리티가 좋지 않게 느껴진다 등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사항이라면 알리지 못할 이유가 없고, 명확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다음 기회에 그들이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상대에게 상처나 실례가 될까 봐 혹은 불편한 말을 하는 게 꺼려져서 "저는 좋은데 저희 팀장님은 마음에 안 드신대요"처럼 윗사람을 '이유 없이 심술부리는 악역'으로 만드는 말은 하지 맙시다.
실제로 담당자인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팀장은 '아니다'라고 한 상황이라 해도, 팀장이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희 팀장님은 제안 내용 중 매체 계획 파트가 저희 타깃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네요"처럼 이유와 함께 전하는 게 좋습니다. 싫든 좋든 팀장도 우리 팀의 구성원입니다.
맥락 없이 퇴짜를 놓는 팀과는 누구도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팀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팀을 위해서 이런 친절함은 삼가도록 합시다.
직장인의 '나쁜 친절함' 속에는 불편한 상황이나 대화를 감내하지 않으려는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불편함은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업무의 일환입니다. 친절함을 가장하여 자신이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나는 4시간만 일한다>의 저자 팀 페리스는 '한 사람의 성공 여부는, 그 사람이 기꺼이 감당한 '불편한 대화'의 숫자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불편함을 어마 무지하게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직장인 1n년 차다 보니 어쩔 수 없이 1일 1회 이상 불편한 대화를 하며 사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불편한 대화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너무 괴롭지만,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다 보면 훈련이 됩니다.
불편한 게 싫어서, 미움받는 게 두려워서 친절함을 선택하는 중이라면, 기억합시다. 당신은 편하려고 입사한 것도, 사랑받기 위해 입사한 것도 아닙니다.
일을 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입사한 사람입니다.
따라다따 작가님의 글 더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