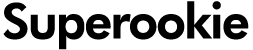"주말에 여자 친구랑 뭐 하면서 놀아?"
응? 이런 게 왜 궁금한 걸까. 뭔가 특별한 대답을 원하는 것 같은 눈빛. 부담스럽다.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그게 다죠 뭐."
상대가 원하는 대답은 이런 게 아니겠지만 이런 대답밖에 해 줄 수가 없다. 남들도 다 비슷하지 않나? 가끔은 특별한 이벤트나 활동을 하겠지만 보통은 이러고 논다. 뭔가 색다른 데이트 계획이 필요한 걸까? 사랑하는 사람만 옆에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웃음)
데이트 코스를 짜 오지 않는 남자 친구 때문에 화가 난다는 사연을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다. 여기에서 점심을 먹고, 저기로 이동해서 무엇을 한 후, 요기에 들러서 잠깐 이걸 하다가, 저녁엔 거기서 디너를 즐기는. 식순이 정해진 무슨 행사 같은 이런 데이트가 재미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남자가 데이트 코스를 짜 와도 여자는 화를 낼 것만 같다.
"이렇게밖에 못 짜 와? 뭐 좀 특별한 거 없어? 다시 해!" 코스의 심판관이자 코스의 최종 컨펌자. 내 여자 친구가 이런 분이 아니라 정말 다행이다. 이런 연애는 오래전에 졸업했다.
여자 친구와 나의 데이트는 대부분 무계획이다.
일단 집 밖으로 나간다. 그날 기분에 따라 갈 동네를 정한다. 여자 친구가 가보고 싶어 하는 카페나 식당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동네로 정해진다.
동네에 도착하면 먼저 어딘가로 들어간다. 밥을 먹거나 배가 고프지 않다면 커피를 마시러 간다. 체력이 젊을 때 같지 않다. 이동하는 것만으로 피로해지는 나이가 됐으니, 우선은 앉아 쉬며 피로를 풀어줘야 한다.
그렇게 앉아서 무언가를 먹으며 수다를 떤다. 가게 분위기가 독특하다는 둥, 여긴 밑반찬이 맛있는 걸 보니 분명 음식도 아주 맛있을 것 같다는 둥. 주로 쓸데없는 얘기들이다.
배도 채우고 피로가 좀 풀리면 밖으로 나와서 동네 산책을 한다. 산책이라고는 하지만 헤매는 것에 가깝다. 목적지도 없고 뭘 하고 싶은 것도 없다. 그냥 무작정 여기저기 헤매며 돌아다닌다. 그러다 흥미를 끄는 가게가 있으면 들어가 보기도 하고, 독특한 분위기를 발견하면 그 앞에 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 옛날에 내가 살던 동네도 이런 분위기였다는 둥, 이 건물은 깨끗하게 칠하면 정말 예쁠 것 같다는 둥. 역시 쓸데없는 얘기들이다.
날씨가 좋으면 산책이 훨씬 즐겁다. 바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분이 좋다. 이런 날은 안 걸을 수가 없다.
"이쪽으로 가 볼까?" 동네 산책을 많이 하다 보면 감각적으로 어디로 걸어야 하는지 알게 된다. 뒷골목이다. 큰길보다는 인적이 드문 뒷골목으로 들어가야 재미난 것들이 많다.
뒷골목을 헤매다 보면 막다른 길을 만나 되돌아 나오기도 하고,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멀리 옆 동네까지 걸어가기도 한다. 당황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정해진 목적지는 없으니까. 옆 동네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 더 재미있다. 그러다 좋은 분위기의 술집을 발견하는 행운도 얻는다. 이런 곳에 이런 술집이? 마침 다리도 아프던 차에 무작정 들어가 본다.
가게 분위기며 맛있는 안주며, 너무 맘에 들어 스마트폰에 검색해보니 이미 유명한 맛집이란다. 우린 어쩜 이리 감각적으로 맛집을 알아보는 거냐며 자화자찬이 이어진다. "여기요!" 술을 더 시키지 않을 수 없는 저녁이다. 쓸데없는 얘기들과 쓸데없는 짓들로 오늘 하루도 자알 놀았다.
만화 '우연한 산보'의 주인공은 낯선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걸 즐기는 인물이다. 외근을 나갔다가 볼 일을 마치고 그 주변을 둘러보는 식으로. 그러다 종종 길을 잃고 어딘지 모를 곳에 이르기도 하는데 그럴 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역시 난 산책의 천재야. TV나 잡지에 나온 곳을 찾아가는 산책은 산책이 아니다. 이상적인 산책은 '태평한 미아'라고나 할까." 진짜 태평한 양반이다. 그런 태평함을 지켜보는 게 이 만화의 매력. 읽다 보면 나도 마구 길을 잃고 헤매고 싶어 진다.
이런 태평함이라면 어느 동네, 어느 여행지에서도 즐거울 것 같다. 너무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다는 건 '성취'의 영역이지 '재미'의 영역은 아니다. 보라, 목표를 향해 낭비 없이 일직선으로 달려가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는 남자의 쇼핑은 효율적이지만 얼마나 재미없는가. 반면 여자의 쇼핑은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다가 원래의 목적도 잊고 마는 무아지경의 재미가 있다. 우연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목적 없는 헛걸음. 이런 게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진짜 재미가 아닐까.
철저하게 여행 계획을 짜서 해외여행을 갔다가 자기 계획대로 여행이 잘 안 풀리자 중간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을 알고 있다. 15분 간격으로 온다는 버스는 한 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길을 잃어 한참을 헤매고, 그렇게 힘들게 도착한 식당은 폐업했고. 그런 일들은 여행지에서 늘 일어난다. 그걸 못 견디고 돌아왔다니 안타깝다. 그러고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여행은 계획을 이행하러 떠나는 미션이 아니다.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 그대로 될 리도 없고, 그대로 안 된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다. 언제나 계획은 필요한 것이지만 계획에 얽매이는 것은 의무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챙겨야 하는 진짜 준비물은 계획표가 아니라 '태평함'이 아닐까. 비즈니스도 아니고 놀러 가는 건데 태평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데이트도, 산책도, 여행도. 가능하면 인생도.
목적 없이. 우아한 헛걸음으로. 즐거움은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