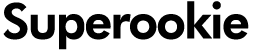나만의 세상, FRAME을 찾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화면은 직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예전엔 4:3의 비율이 제일 많았고 지금은 HD가 보편화됨에 따라 16:9 정도의 비율이 제일 많아졌다. 한 때는 왜 화면은 항상 직사각형의 형태를 띠는가?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렌즈도 원형인데 왜 사각형으로 프레임을 구성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렌즈의 가장자리의 왜곡현상과 상을 맺히게 하는 반사체를 고려했을 때, 그 당시엔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던 것이 자연스럽게 직사각형의 형태로 자리매김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화면의 안정적인 느낌을 고려하면 원형보다는 사각형의 형태가 적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요즘에는 다양한 디스플레이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사각 형태의 프레임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모양으로 발전시켜나가는 트렌드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특히 예술계에서는 벌써 발 빠르게 시도하는 예술가들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스페인의 유명한 예술가인 마리스칼의 경우 사각 프레임을 벗어나서 그만의 독창적인 프레임으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우리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기도 했다. 여하튼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영상의 프레임은 사각형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프레임 안에 세상을 넣어서 보는 것은
느낌이 많이 다르다. 양손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것 만으로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눈으로 보는 세상에는 보이는 데로 모든 정보들이 가감 없이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일단 나만의 사각 프레임을 만들게 되면 내가 담고 싶은 모습들만 골라 담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다가가거나 뒤로 가지 않으면 담지 못하는 것들도 생긴다. 이로써 우리는 나의 프레임에 담고 싶은 사물에 다가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면서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는 경험을 한다. 또한 우리에게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렌즈가 있기 때문에 촬영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렌즈를 활용할 것인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사각 프레임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두 손가락을 마주하여 만드는 사각형이라도 어떠랴?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 영상의 길을 가려고 마음먹었다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사각 프레임 정도는 몇 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구도를 잡거나 간단한 스케치나 영감을 위해서도 썩 좋은 도구가 되어 줄 것이다.
(대학 때로 감정이입이 되어 이렇게 썼으나 사실 이제는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직접 써보는 것이 가장 편하다.)

나만의 프레임에 대해서 고민하던 즈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보이는 그대로를 담아내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의도대로 재구성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어려운 문제였다. 하나의 답을 도출하기엔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보이는 그대로를 담아낸다고 치면, 과연 그 영상이 제대로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담고 싶은 부분을 담고 치울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연출된 것들을 담는 것이 필요한가? 물론 장르에 따라서도 다르고 생각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난 영상작업 자체가 하나의 재창조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사실주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촬영하는 촬영감독의 느낌과 영감이 살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똑같은 사과를 그리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르게 그릴 것이 분명하다. 영상도 마찬가지 아닐까? 아무리 똑같이 찍으라고 해도 약간의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저마다 생각하는 구도도 다를 것이고, 시점도 다를 것이다. 색이 달라질 수도 있고, 보이는 부분도 제각각 일 것이다.
세상을 보는 시점에 따라서 영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르게 느끼는 부분이다.

간단한 것을 촬영하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당신은 예술을 하는 것이라 감히 말할 수 있다. 단순한 작업인 것 같지만 그것이 나만의 프레임으로 재창조하는 시작인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새롭게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것이다. 누군가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며, 누군가는 차가운 냉소를 띄며 바라볼 수도 있다. 매사에 불만스럽게 바라볼 수도 있고, 날카로운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좋다. 나만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보면 좋겠다. 주변의 환경이나 삶의 태도, 그리고 그날의 날씨나 그 밖의 많은 영향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촬영감독들이나 연출 감독들은 그 들만의 색을 지니고 있다. 기왕에 이쪽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뭔가 나만의 색을 가지는 것도 참 뿌듯한 일일 것이다. 나 역시도 나만의 프레임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다. 과연 나는 어떤 것을 찾고 어떤 것을 찍고,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말이다.

© matthewkalapuch, 출처 Unsplash
난 따뜻함이 좋았다. 따스하게 내 눈을 찡그리게 만드는 햇살이 좋았고, 운동하다가 흘리는 땀방울도 좋았고, 바람에 춤을 추는 나뭇잎도 좋았다. 푸르고 푸른 잔디 위에 들꽃도 좋았다. 무엇보다 해맑게 웃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좋았다. 그랬다. 나는 그런 따스함 들을 나만의 프레임에 녹여내고 싶었다. 무엇인가 모르게 따뜻함이 묻어나는 그런 영상들을 담아내고 싶었다. 물론 모든 영상에 모든 프레임에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찍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면 어딘가 모르게 따스함이 녹아 있을 것이다. 그런 따스함을 녹여내는 나만의 프레임을 갖고 싶었다. 내가 만들어낸 영상 속에 담긴 따스함으로 누군가가 살짝이라도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나만의 프레임인 것이다.
영상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작지만 나만의 철학을 한 번 생각해보고 나만의 프레임에 새겨 넣는다면 앞으로의 만들어질 우리의 작품들에게는 새로운 숨결이 생길 것이다.

그대만의 프레임은 무슨 색을 지니고 있는가?
심PD 작가님의 더 많은 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