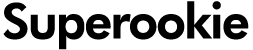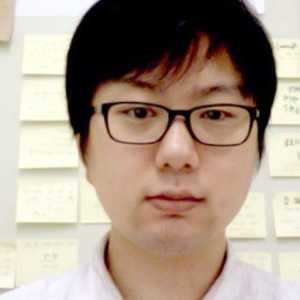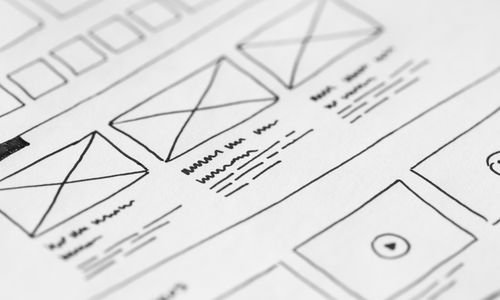몇 년 전, UX를 전공하는 학생을 만난 적이 있었다. 학생이라고 하지만, 대학원생이라 당시에 나이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다. 당시에 프로그래머와 앱을 하나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올린 상태였고, 초기 반응은 나쁘지 않은 상태였다.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UX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UX에 대해 더 몰랐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한 사람의 의견과 태도가 절실했다. 그런데 몇 번의 이야기가 오가다가 그가 한 말은 나를 놀라게 했다.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신중한 답변이었지만, 당시의 나는 그 말의 의미에 대해 격앙되었다. 교수님은 이 자리에 없고, 이 대화를 듣지 못했는데, 어떤 부분을 교수님에게 물어본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는 그 태도를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그때의 대화에서 세 가지 실수를 했다.
첫 번째, 그 사람에게 정확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 사람에게 내가 대화의 상대방이 되지 못했다. 나는 공격자가 되었다.
세 번째, 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었다.
충분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박을 가하면, 대화를 진행할 수 없다. 특히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 기준을 모르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한 '교수님에게 물어보겠다'는 말은 사실상 대화를 끝내겠다는 말이었다.
그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나는 내가 정당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했다. 요즘도 나는 대화에서 가끔 공격적이 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나는 내가 옳은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물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내가 옳은 입장에 서 있는 것보다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위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야 하는 태도였다.
내가 대화했던 대학원생은 결국 나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고 난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시간을 낭비했다. 누군가 '이게 맞는 건가?'라고 궁금해하면, 그건 당신의 기준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만들기 위한 방법과 경험이다.
일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기존에 있던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선임자가 실수했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한다. 그리고 그걸 멍청하게 바라보는 것은 효율적인 태도가 아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다른 실수를 해야 한다. 10년 전에는 UX 디자인은 지금처럼 널리 퍼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인터렉션, 모션, 인터페이스, 감성, 소셜 수많은 디테일들이 넘쳐난다.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당신 회사에 막 들어온 사람은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왔다. 지난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났는지 되새겨 보자.
- 머티리얼 디자인이 퍼지고, 플랫 디자인이 화두가 되고,
- 스케치의 사용이 늘어나며 프로토타이핑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 IoT, O2O, 소셜 마케팅이 이슈가 되고,
- 음성 인식과 채팅 UI가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일상적인 표현에서 회사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회사는 변하는 시장에 적응해야 한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사람을 기존 회사에 적응시키면 회사는 변하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에너지와 생각을 회사에 공급해주는 사람이다. 부하 직원의 시대는 20세기에 끝났다. 인턴 직원이 회사에서 반복적인 일을 하다가 사라질 때마다 답답하다. 가치있는 일과 가치 없는 일을 구분하고 가치 없는 일을 적은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미루는 관점이 옳은 건지 항상 고민된다. 이직율이 높은 시대에서 사람이 오고 떠나는 일은 자연스럽지만, 함께 하는 시간이 짧아도 모두에게 의미 있어야 한다.
특히 디자인을 하고 있다면,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신입이 '이거 맞아요?' 물어볼 때 조금만 더 친절해지자. 그 사람이 내일 당장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그 경험은 나에게 남는다. 짧은 순간 사용자에게 기억이 남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신입도 사용자다. 나는 내가 신입에게 느낌표를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선주 작가님의 더 많은 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