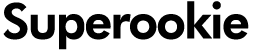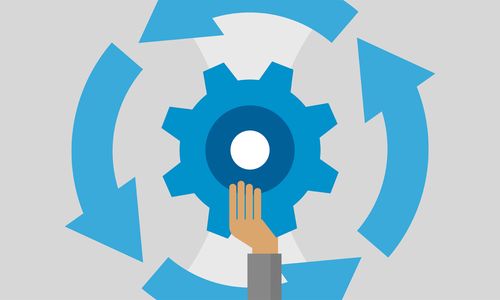구매가 절감으로 정신없는 K로부터 어제 연락이 왔다. 전체 구매 흐름을 보지 못한다고 자꾸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는다고 한다. 구매담당자는 흐름 전체를 봐야 실질적인 구매가 절감도 가능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애기란다. 벌써 K가 근무한 지 1년이 다 돼가니 그럴 만도 하다. K의 상사가 누군지 몰라도 날카로운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구매담당자는 흐름 전체를 봐야 한다. 쉽지 않은 주문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어떤 협력사가 구매업체에 원료 A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협력사는 원료 A 제조에 필요한 핵심 물질 B를 해외 제조사에서 수입한다. 하지만 직접 수입을 하지 못하고 국내 독점 대리점, 즉 수입업체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들의 먹이사슬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 제조사(Maker) > 수입업체(Sole Agency) > 협력사(Supplier) > 구매업체(Purchase Order)
이러한 먹이사슬 구조에서, 해외 제조사가 공급물량을 줄이면 구매업체는 단번에 비상이 걸린다. 물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수입업체가 인건비를 올리면, 원가상승 요인의 부담이 된다. 바보가 아닌 이상, 협력사가 밑지고 우리 회사에 납품을 할 리가 없다. 마지막으로 협력사에 예기치 못한 돌발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계약된 납기를 보장할 수가 없다. 협력사의 생산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공급이 계획대로 진행될 리가 만무하다.
물량이 줄고 단가가 상승하고 납기가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공급 체계에 트러블(Trouble)이 발생하면 구매담당자는 공급망(Supply Chain Management) 전체를 챙겨봐야 한다. 단순히 협력사 한 곳만 봐서는 실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협력사에게만 문제를 해결하라고 닦달하는 담당자도 있다. '나머지 공급 과정은 잘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머리 아픈 문제들은 협력사가 제발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것 말고도 머리 아픈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뭐 이런 이유다. 한마디로 여유가 없다는 애기다. 어쩌면 그게 구매 현장의 진짜 모습인지도 모른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일이 해결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과거에는 협력사를 잘 조져(?) 대는 것이 구매담당자의 능력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날 구매는 노련한 협상가를 필요로 하지, 단순한 협박 전문가를 원하지 않는다. 겁박을 통한 문제 해결은 가장 낮은 단계의 ‘삽질’을 의미한다. 힘으로 땅만 파대는
“상무님! 발주서 상의 계약 납기에 동의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김대리.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잖아. 유럽에 있는 메이커(Maker) 쪽에서 갑자기 생산량을 줄이는 걸 낸들 어떡해?”
“제가 그것까지 신경 써야 합니까? 저는 상무님 회사와 계약을 한 거예요. 유럽 쪽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무슨 일이 있어도 납기 내에 물건 넣어주세요.”
“김대리, 내가 그걸 지금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 그게 일정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거잖아.”
“상무님, 그러면 계약을 파기하시면 되겠네요? 납기 지연에 대한 페널티(Penalty) 비용을 내시면 되지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데, 자꾸 왜 그래? 허, 거 참. 난감하네.”

이런 구매담당자의 대응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진정한 문제 해결의 방법도 아니다. 물론 발주서가 발행된 이상 공식적인 책임은 협력사에게 있다. 하지만 협력사가 본인의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매담당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협력사의 구조요청(SOS)을 무시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최악의 경우, 공급물량의 부족으로 회사의 제조라인이 멈추게 될 수도 있다. 구매담당자가 협력사 한 곳만 바라보고 ‘삽질’만 해 댄 결과다. 물론 회사는 협력사에게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구매의 궁극적인 목적은 손해배상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라인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다.
카멜 작가님의 더 많은 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