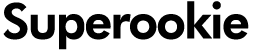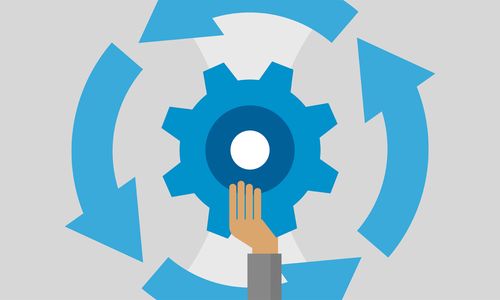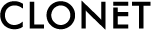K가 구매업무를 맡은 지도 벌써 일 년 반이 넘었다. 이 기간이 되면 K뿐만이 아니라 모든 담당자가 자기 업무에 회의를 갖게 되는 시기다. 구매의 역할과 담당자의 책임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만큼 자기 업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초심으로 돌아가 구매에 대한 자신만의 개똥철학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필자가 생각하는 구매에 대한 나름의 개똥철학이다.
구매부서의 고객은 회사 내부의 구매 요청자와 회사 밖의 공급업체다. 이 두 고객이 존재하지 않으면 구매도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고객은 왕이다. 좋든 싫든,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
구매담당자 입장에서, 구매 요청자의 요구사항이 곧바로 공급업체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즉 물건을 사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최적의 업체를 연결시켜 서로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다. 요청자는 원하는 물건을, 공급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다. 고객과 고객, 왕과 왕의 욕구와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것, 그것이 구매담당자가 하는 일이다. 이게 한방(?)에 끝나야 한다. 뭐든지 한번 꼬이면 계속 꼬인다. 구매도 마찬가지다. 이슈가 되는 자재, 문제가 있는 업체가 계속 트러블(Trouble)을 발생시킨다. 그게 참 묘하다.
구매 과정에 트러블이 생길 경우, 구매담당자는 심판자의 위치에 설 수도 있다.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에는, 구매의 입장이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우선 요청자가 보기에, 구매담당자는 공급업체와 긴밀한 관계(?)로 비친다. 구매팀이라고 하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는 과거의 근거 없는 전통(?)이 여기에서 기인한다. 구매윤리가 유독 강조되는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이야 많이 나아졌거나 나아지고 있지만, 옛날의 구매는 분명 후진적인 면이 있었다. 전혀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순전히 구매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공급업체는 선택이 된다. 물론 추천이나 소개를 받기도 하지만, 최종 결정은 역시 구매담당자가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업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구매의 몫이다. 즉 공급업체 실수는 구매의 업체 선정의 실패를 의미한다. 누구를 탓하겠는가?

공급업체 입장도 마찬가지다. 업체 시각에서 구매담당자는 요청자와 한 통 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당연하다. 같은 회사 사람이 아닌가? 팔은 안으로 굽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구매담당자가 그렇다. 어떤 경우에는 요청자보다도 한 술 더 뜨는 담당자도 더러 있다. 전형적인 갑질이다. 하지만 요청자의 불합리한 요구는 구매담당자가 막아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업체의 공급채널에 혼선이 생긴다. 공급업체의 계약 상대는 구매담당자다. 절대 구매 요청자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구매담당자가 이를 극복해 내지 못하면 스스로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구매담당자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다. 흥미롭지 않는가? 주변인 또는 경계인 같기도 하다. 아니면 박쥐인가?
이처럼 구매업무가 절대 쉬운 게 아니다. 쉽다고 생각하거나 느낀다면 구매의 본질을 모르는 구매담당자일 공산이 크다. 구매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다. 또한 터무니없는 오해와 루머에 시달릴 수 있다. 이 바닥이 특히 그게 심하다. 어떤 식으로라도, 구설수에 휘말리면 자기 업무에 추진 동력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신입의 경우, 선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서양 속담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다.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고 뭐 특별한 비법은 없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Back to the Basic! 회사 이익을 기준으로, 사규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면 될 일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예매한 일일수록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면 될 일이다.
카멜 작가님의 더 많은 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