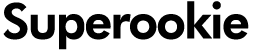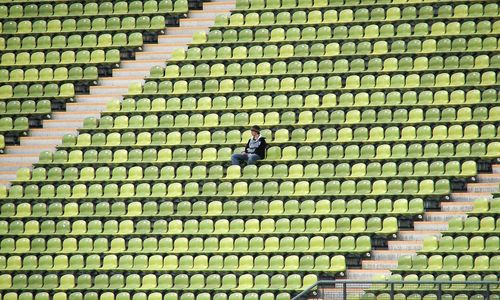공 : 회사 회사 사람과의 관계, 회사 혹은 사장과 관련된 사회적 사건,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람과 기관
사 : 나를 중심으로 얽힌 모든 것.
공과 사를 분리하여 일하기란 쉽지 않다. 출근 이후 직장인은 회사에 얽매여 있다. 퇴근 이후 시간도 일의 연장이란 명목 하에 갖가지 행사들이 비집고 들어오기 일쑤이다. 나만을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직장인 모두의 공통적인 고민이다. 나 역시도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 게다가 이 업계가 야근과 철야를 밥먹듯이 하는 예술하는 전문직종이다 보니 개인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기본자세에 대한 이야기(열정 같은 소리)를 듣게 된다. 막상 그만두고 나니 이 많은 시간을 주체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게다가 그만두기 직전인 희망퇴직 선택기간은 나의 내면의 폭풍이 몰아치고 모든 것이 뒤섞여 정신이 하나도 없던 시간이었다.
하필 희망퇴직을 공고한 주는 촛불시위 첫 번째 주였다. 촛불집회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 (보통 평범한 20~40대 직장인)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 나간 촛불집회에서 앞으로 나의 삶이 사회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 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내 삶에도 촛불이 일렁이며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우연이지만 덕분에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회사보다 더 큰 사회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나는 이 사회에 어떤 존재였나. 한낱 개인에 불과할 나이지만 촛불 하나 보태고 나니 뭔가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된 듯한 기분이 들어서였는지 존재감을 찾아보고 싶어 졌다. 그런데, 기억을 더듬을수록 선명해지는 그날들은 하나같이 다 부끄러운 일들 뿐이었다.
나의 옛 회사에는 박씨, 최씨, 문고리 3인방, 십상시가 모두 있었다. 인력 효율화를 앞세워 희망퇴직을 말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대표는 직원들에게 책임을 느끼며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역대 가장 많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임원들은 잘리기 전에 회사 돈으로 더 많은 나라를 가고 싶어 하는 욕심을 직원들 앞에 숨기지 않았다. 모든 프로젝트들은 윗사람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실무자들과 임원들의 알 수 없는 밀담 후 결정되었고 정작 결과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프로젝트라 말하지 않았다. 잘되면 내 탓, 안되면 직원 탓은 모두가 수긍하는 관습이었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직원들 누구도 대들지 않았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작은 프로젝트를 맡은 이들은 조용히 내 일만을 신경 쓰고 각종 특혜와 비리들이 난무하는 대형 프로젝트에는 이름을 빛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소리 없이 피 튀기며 충성 경쟁을 벌이곤 했다. 어디나 그렇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냐며 그나마 이 회사는 대기업이라 나은 거라며 자기합리화를 했던 게 지난 9년이었다. 그런데 그 회사 안에서 지지고 볶느라 나는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외면했다. 투표하는 것만으로 내 역할을 다 했노라며 맘 편하게 지냈다. 이제 와서 부끄럽다 얘기하는 것도 뒤늦은 후회이고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변명에 불과하다. 회사의 취지가 나와 맞지 않는다고 사표를 쓴다면 내 자리는 누군가 메꿀 것이고 이 회사가 바뀔 일은 없을 것이니 그저 눈감고 그냥 회사를 다녔던 거다. 직장인으로서 '회사와 나'말고는 없었던 거다.
세월호 7시간 기사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건 그 날의 내 일과가 기억나기 때문이다. 당시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름만 대면 모두가 다 아는 땅부자인 어느 기업의 말도 안 되는 사업에 타당함을 포장하고 있었다. 직업윤리에 하나도 맞는 게 없는 보고서에 거짓말을 진실처럼 매끈하여 고쳐 놓은 것도 나였다. 평생 나 스스로를 혜택 받지 못한 소시민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런 소시민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몇백 배의 가치를 부풀려 팔아치운 정부와 그 가치를 다시 배로 튀긴 기업의 이익을 위해 그날도 고군분투했던 것이다. 시간이 좀 지나 세월호에 선적되어 있다는 화물이 어느 현장이었는지 기사화되기 시작했다. 내게는 그 현장의 일을 따기 위해 보냈던 6개월의 시간이 있었다. 그 당시엔 경쟁사에 져서 억울하고 분했던 것 같은데 막상 그런 일이 있고 보니 떨어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쟁사보다 나은 안이라고 함께 했던 동료들과 속상해했는데 만약 이겼다면 어땠을까. 경쟁사의 직원들은 그 당시도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 것 같았는데.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했던 것이라고 하면 나는 괜찮은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 가장 고민인 요즘.
'어떻게 먹고살아야 할까'에 집중했던 어제가 생각난다.
방관자
나는 9년 동안 사회의 구성원이었지만 내 주변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놓고 그 안에서 서성이기만 했던 사회의 방관자였다.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다. 내 등록금으로 인한 대출금을 다 갚아드렸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만들어야 했던 전세금을 돌려드렸다. 그렇게 나는 전세자금 대출을 하느라 은행 문을 두들겼고 회사는 나의 배경이 되었다. 다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회사를 나와보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사람도 많다. 내 동그라미 안에 없었을 뿐.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나는 방관자였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떤 키를 쥐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눈을 질끈 감았기에 더 원활하게 진행되었던 모든 일들은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 갑자기 느껴지는 무게감을 어찌할까. 그 무게감이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이라면 그게 내가 받은 그동안의 연봉과 희망퇴직으로 주섬주섬 챙겨 받은 대가라면 나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안정감 있게 내일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삶,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이 주어지지 않은 현실을 탓해야 하나. 만약 사회적인 보장이 강하게 되어 있다면 나는 저항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결국은 내가 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원망할 자격이 없는 거다. 평범한 사람들이 무관심할수록 사회는 보통 사람들에게 불리해지고 있다. 대기업에서 가장 내세우는 윤리강령들이 현실에서 제일 실현되기 힘든 가치라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다. 실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총대 메고 고쳐나갈 수 없다. 게다가 나는 그게 싫어서 뛰쳐나오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도돌이표이다.

NanA작가님의 더 많은 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