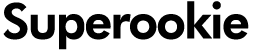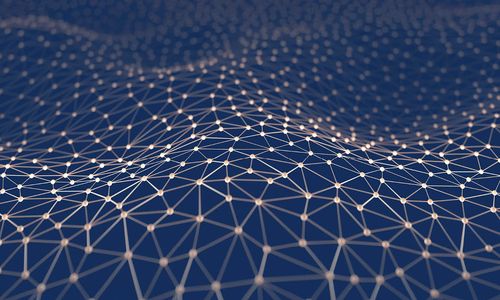얼마 전 지인과 점심을 먹다가, 지인 동생 얘기가 나왔다.
"동생은 PD 준비해. 요즘 MBC인가... 취업 준비한다고 고생 중이야. 보면 짠해."
"그렇겠네요. 근데 제가 잘 모르지만... 요즘 지상파가 의미 있나요? 유튜브나 제작사들이 더 세지 않나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동생한테 말하니 동생이,
'누나, 누나 지금 회사 어떻게 갔다고 생각해?'
'응? 뭐... 컨설팅펌 다녔던 게 좀 크지'
'그거야, 일단 처음엔 MBC를 가야 다른 데도 갈 수 있는 거라고' 이러더라."
그냥 한담으로 나눈 얘기지만, 왠지 모르게 며칠 뒤에도 계속 생각이 났다. 두 가지 생각이 섞인다.
먼저 왠지 모르게 부아가 치민다. 왜 채용은 이런 시스템이 된 걸까? 아니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첫 커리어가 그렇게 많은 걸 결정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인생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인데.
낮은 데부터 시작해서 인정받고, 하나씩 더 좋은 데로 이직해 올라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왜 처음부터 위에서 시작해야만 하는 거지? 거꾸로 된 거 아냐?
그동안 주변에서 그런 고민 사례를 너무 많이 들었다. 또 이런 구조에서 고통받는 1020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본다. 평소 뉴스를 봐도 1도 생기지 않던 정의감? 분노? 같은 게 올라온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론, 왜 이런 시스템이 된 건지 너무 잘 이해한다. 사회에서 경력 채용과 이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씩 보기 때문이다.
결국 채용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우리는 드래곤볼에 나오는 스카우터가 없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꿰뚫어 보지 못한다. 그냥 대충 프록시를 때려 짐작할 뿐이다. 진짜 전투력은 모르니, 출신 학교와 첫 커리어 정도만 저장해두고 그걸로 사람의 역량을 판단한다. 그걸 기반으로 수많은 이직 기회가 주어진다.
누구나 이성적으론 그게 다가 아닌 걸 안다.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게 효율적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뭐. 말만 하지 않을 뿐, 사실 마음속 판단에는 큰 영향을 준다.
예전에 인적자원 수업 시간에 '시그널링 이론’을 배운 적이 있다. 대학은 실제로 학생을 키워주는 의미보다, 그냥 선별해서 이름표를 붙여주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나는 이 이론에 백번 동의한다.
결론적으로 스타트업의 시대니, 유튜브의 시대니 해도 사회초년생들은 일단 대기업과 방송국을 박터지게 뚫고 들어갈 수밖에.
누군가 악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알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게 씁쓸하다. 'MBC를 가야 다른 데도 갈 수 있는 거라고'라는 말을 자꾸 곱씹게 된다.
송범근님 글 더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