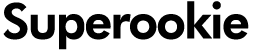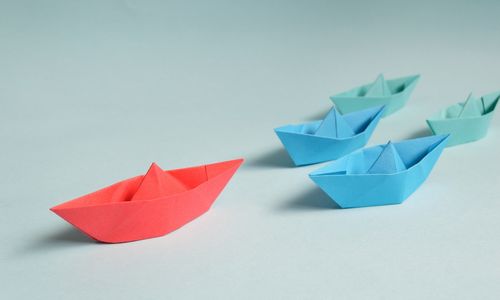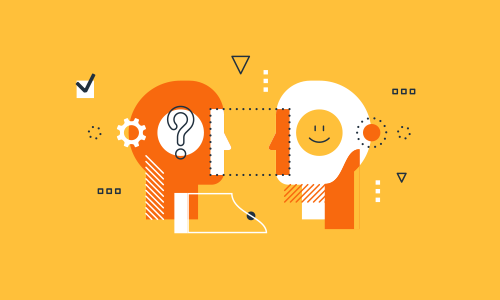큰 발표에서 떨지 않고 잘해내는 법
대학교를 졸업하고 6년 정도의 한국 회사 경험을 한 후, 미국 IT 회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바로 약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오는 대규모 이벤트에서 대중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임무가 맡겨졌다. 아, 그때 느꼈던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13년이 지난 지금도 느껴질 정도.
약 40분 정도의 발표였는데, 정말 페이지마다 스크립트를 쓰고 그걸 모조리 외워버렸다. 발표하는 당일에는 발표 1시간 전에 몰래 행사장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아내가 준비해준 우황청심환을 원샷했다. 발표가 겨우 끝나고 나서는 바로 소주를 먹으러 가서 오바이트 전까지 취해버렸다.
지금은 어디 가서 발표를 못한다는 말은 안 듣고 큰 발표도 떨지 않고 해내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건 여전히 스트레스다.
우리는 모두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그렇다. 커뮤니케이션이 향하는 대상의 수에 따라 갈린다. 즉 상대해야 하는 청중의 수에 따라서 개인의 호불호와 강약점이 교차한다.
어떤 사람은 큰 발표 스타일에 강하다. 청중이 많을수록 빛을 발하며 미리 준비된 내용과 즉흥적인 임기응변을 통해서 대규모의 청중에게 얘기하는 걸 즐긴다. 프레젠테이션하면 떠오르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규모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편하다. 그중에서도 나뉜다. 특히 1:1로 만나야 강점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다. 동료 중 한 명은 여러 명이 술자리를 가지면 거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둘이서 저녁을 먹게 되면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대화를 주도한다.
거꾸로 둘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은 여러 명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할 때 더욱 빛을 발하고 좌중을 압도한다.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대상의 수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사실 대규모의 발표에 능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일단 발표라고 생각하고 일어서서 파워포인트나 키노트를 띄울 생각을 하면 식은땀부터 난다. 손이 덜덜 떨린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부담스럽다. 준비한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익숙한 상황 아닌가?
물론 발표에 익숙해지면 누구나 떨림도 덜해지고 잘하게 된다.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얼마 안 되는 주어진 기회 안에서 큰 발표가 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최대한 실패하지 않기 위한 내용이다.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발표가 편한 사람들도 큰 발표를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
1. 준비만이 살 길이다 (스크립트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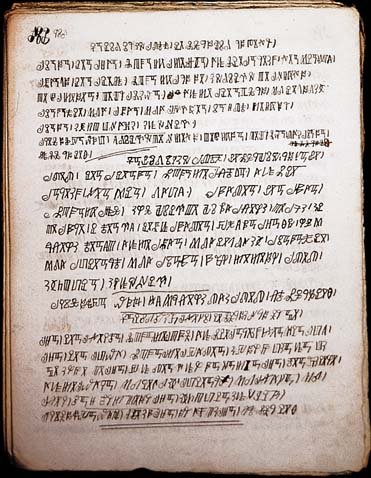
스크립트
성공적인 발표는 자신감이 필요하고 자신감은 철저한 준비로부터 나온다.
물론 정확한 콘텐츠 준비가 먼저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콘텐츠를 준비하느라 발표 자체에 대한 준비를 못 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 2주를 꼬박 밤새워 프로토타입을 만든 후 발표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막상 발표 때에 우와좌왕했던 경험이 있었다.
발표가 자신 없을 때는 해야 할 말을 모두 스크립트를 써서 외우면 된다. 처음 대중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맡았을 때 모든 할 말을 모두 스크립트화해서 외워버렸었다. 지금도 중요한 발표는 작던 크던간에 스크립트를 작성한다. 스크립트를 작성하면 좋은 점이 많다. 내용이 정리가 된다. 처음을 잘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 발표의 처음이 잘 시작되면 마음이 안정된다. 꼭 외운 스크립트대로 하지 않아도 자기 페이스로 발표를 계속할 수 있다.
2. 발표는 무조건 쉬워야 한다.

SAP Steve Lucas의 발표 제목
독일계 IT회사 SAP에서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 President 스티브 루카스가 올해 했던 키노트의 제목이다.
"최근 비즈니스 현실에서의 변혁을 통한 좌절 없는 혁신"
길고 어렵고 와 닿지 않는다. 사실 진짜 제목은 아니다. 스티브는 이 제목을 보여준 후,
"요즘 혁신을 얘기할 때 흔히 이런 제목을 보곤 하죠. 도대체 이런 제목의 발표를 누가 긴 시간 듣고 있을 수 있을까요?"라고 가지고 온 직관적인 장표로 대체해서 발표했다.
인지과학의 결과에 따르면 낱말이 단순할 때 우리 마음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간결하고 쉬워야 한다. 더 중요한 건, 쉬워야 내용을 까먹었을 때도 쉽게 생각해내고 발표를 이어갈 수 있다. 복잡한 장표 위에서 헤매는 모습은 재앙이다.
3. 가족을 대상으로 연습해본다.
발표에 익숙하지 않던 시절, 중요한 발표가 있으면 아내 앞에서 연습하곤 했다. 물론 굉장히 쑥스럽다. 아내는 나의 발표 분야에 문외한이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하곤 했다.
바로 그 부분들이 도움이 된다. 익숙한 분야를 발표자료를 만들고 내용을 구성하다 보면 많은 것을 당연시하고 생략하게 된다. 다시 한 번 스토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흐름을 정리하는 기회가 된다.
문외한을 이해시킬 수 있으면 누구라도 이해시킬 수 있다. 가족에게 발표하는 쑥스러움을 이겨낼 수 있으면 누구 앞에서라도 얘기할 수 있다.
4. 발표 전에 청중과 사전 교감하면 좋다.
큰 발표에 익숙하지 않을 때 (혹은 익숙해진 다음이라도 많은 경우에) 중압감은 생각보다 크다. 300명 이상의 청중이 앞에 있으면 그 공간과 얼굴들이 희미하게 압박해온다.
그 압박감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일찍 가서 온 청중들과 사전에 얘기를 나누면 좋다. 아는 사람을 찾아내면 좋다. 아는 사람이 없으면 1-2명이라도 인사를 나누는 게 좋다. 오늘 발표를 하는 누구누구라고 얘기하면서 어디서 오셨냐 어쩌고저쩌고. 내용보다도 안면을 트는 게 중요하다.
발표가 시작되기 전 그 사람들이 앉은 위치를 확인한다. 발표는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얘기한다. 보통 큰 발표 때에는 3 지점 정도를 정해놓고 그 세 지점을 번갈아 보면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 좋다.
잘 모르는 군중이 청중인 큰 발표가 3-4명의 아는 (적어도 얘기는 나눠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발표가 되었다.
5. 나의 말은 생각보다 빠르다.

많은 청중을 발표로 하는 것이 익숙지 않은 발표자가 하는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발표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하는 것이다. 발표 시간을 넘겨서 발표하는 것도 문제지만 40분 발표가 20분 만에 끝나버렸을 때의 민망함에 비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아무도 질문도 안 한다. 사실 청중이 많은 발표에서는 거의 질문을 기대할 수 없다.
단상에 올라가게 되면 생각보다 말을 빨리 하게 된다. 발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마추어 신생 밴드들도 공연을 하게 되면 연습 때 하던 것보다 20-30% 템포가 빨라진다. 흥분해서 나오는 아드레날린 탓이다.
너무 천천히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천천히 해야 한다. 사람들이 말을 이해하면서 곱씹을 시간을 주는 면에서도 천천히 하는 게 유리하다.
6. 3의 법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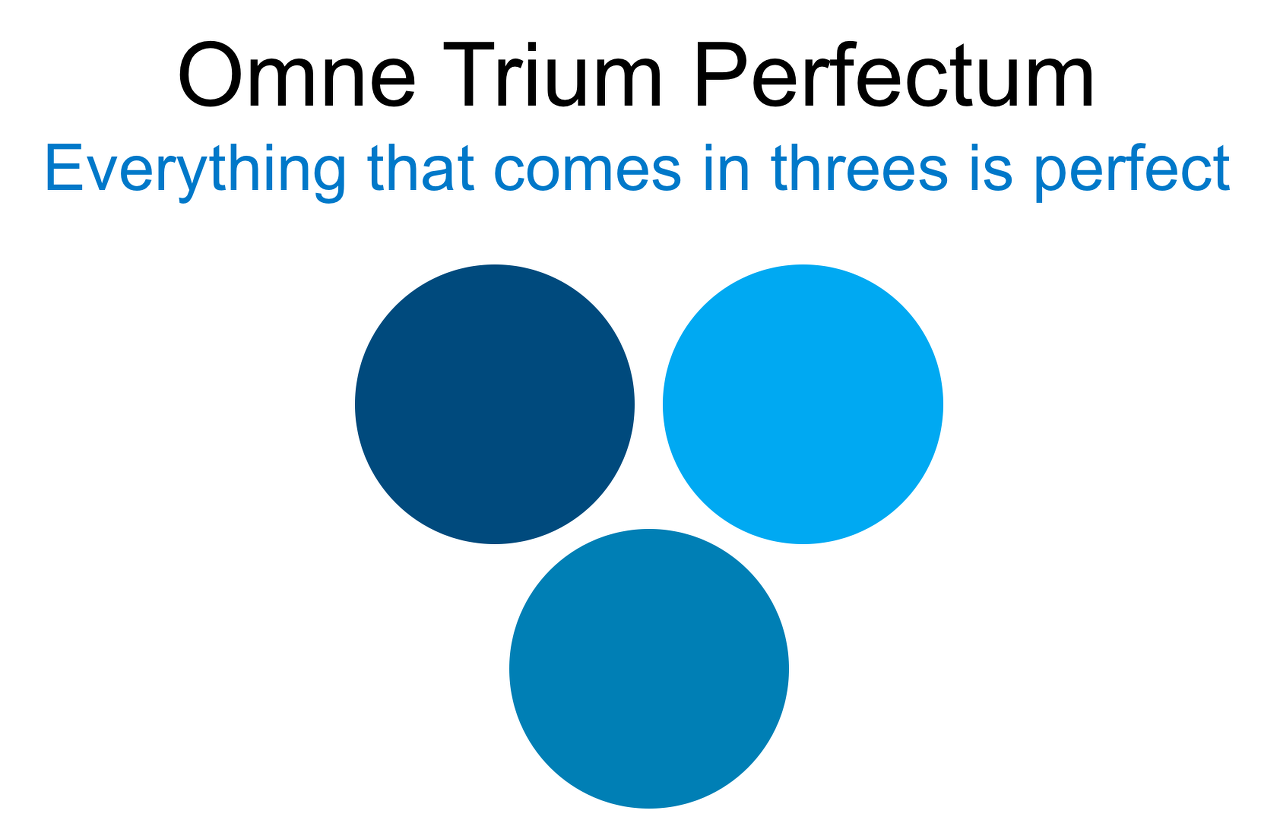
3은 완벽하다.
Omne Trium Perfectum.
라틴어로 '셋으로 이루어진 것은 모두 완벽하다' 란 뜻이다.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으나 이 3의 법칙을 발표에도 적용하면 편리하다. 전체 구성은 세 부분으로 만들고, 한 장표의 불렛 포인트도 3가지로 만든다.
청중은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고 지루하지 않다. 발표자도 항상 3이란 숫자를 기준으로 둘 수 있다.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3 안에서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손가락을 하나씩 펴가면서 제스처 효과를 주기에도 편하다.
한 명을 이해시키는 것과 천 명을 이해시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소규모 발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천명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다. 물론 제대로 준비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조건 하에서이다. 이 글조차 3의 법칙을 지키지 않고 6가지의 주의 사항을 늘어놓았듯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