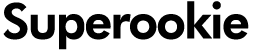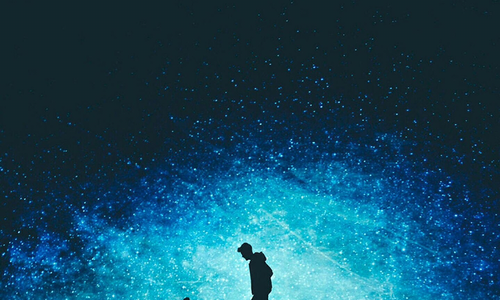학부시절 NGO단체에서 두 달간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적이 있다. 외국 방한객들을 데리고 전국을 일주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당시 나와 함께 일하던 봉사활동자들 대부분이 대학 2~3학년 또래들이었다. 우리는 스펙이다, 경험이다 하는 꾐에 빠져서 두 달 간을 주말, 휴일 할 것 없이 그 NGO 사무실에서 살며 행서 준비에 온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 (물론 '자원봉사자'라는 타이틀을 교묘하게 이용한 NGO 덕분에 신나게 열정 페이 했다)
설상가상, 그 NGO 팀장이라는 사람은 무급 자원봉사자인 우리에게 뻑하면 서류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며 욕설을 날리는 등 전형적인 꼴통 상사였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동안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도 그는 상습적으로 욕을 했는데, 결국 행사 도중에 응어리가 터져 나를 포함한 팀원들 단체로 '보이콧' 선언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 당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돈 십만 원이 아니라 '잘하고 있어'라는 피드백이었을 것이다. 그때 팀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폭력적인 언행과 반응을 보일 게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자기 시간을 들여 스스로 NGO 사무실 문을 두드린 우리는 더욱 신나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를 치렀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랬을 거라 확신한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작은 NGO단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매일 마주하며 산다.
회사에서 매사에 아랫사람을 윽박지르고, 욕하며, 길길이 날뛰는 상사들을 마주하다 보면 저 정도로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정신과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언제부터 이 곳 사내 문화가 폭력과 공포에 기반하게 되었는지, 그 근원은 알 수 없으나 가끔은 이 문화 자체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 사회의 가장 사적인 영역인 가족, 연인관계에서조차 폭력은 엄격하게 금지되는데 왜 사내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폭언은 업무의 일환이자 사회생활의 일환으로 당연시 되는걸까. 왜 상사는 아주 당연하게 부하직원에게 인격모독까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것이며, 왜 부하직원은 그걸 견뎌내는 것이 자기의 당연한 몫이라고 믿는걸까.
웃겼다. 이미 이립과 지천명의 나이를 지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자기 화를 못 이겨 길길이 날뛰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람이나, 그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나. 이게 사회생활이라니. 눈물 질질 짜던 스무살의 나와, 그런 나에게 서류뭉치를 집어던지던 NGO팀장의 모습과 전혀 다른게 없다니.
Jane Gray 작가님의 더 많은 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