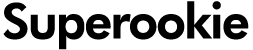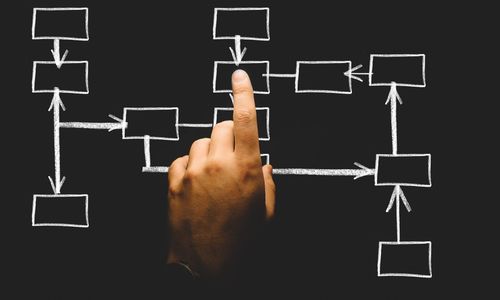사실 한국에서 ‘조직’과 ‘창의력’이라는 단어는 가장 이질적인 조합으로 여겨진다.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창의적인 결과물은 한국의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조직문화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직들은 창의력을 갈구하는 수준으로 원하고 있다. 2016년을 달구고 있는 알파고나 포켓몬고와 같은 사례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거의 모든 조직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갈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직에서 창의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의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창의력은 기존과는 ‘다른’ 혹은 ‘새로운’ 방법 등을 통해 ‘좋은’ 혹은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다른, 새로운’과 ‘좋은, 뛰어난’이다. ‘다른’과 ‘새로운’은 언제든지 시도할 수 있고 시도되지만 정작 조직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과 ‘뛰어난’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더 많은 매출과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방법이 창의적인 것이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더 많은 매출과 이익이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다른’과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다만 그 ‘다른’과 ‘새로운’이 ‘좋은’과 ‘뛰어난’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사실 ‘좋은’과 ‘뛰어난’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다른’과 ‘새로운’ 방법과 시도들은 자판기에서 버튼을 눌러서 정해진 상품을 얻듯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랜 고민과 많은 노력 끝에 선택한 ‘다른’과 ‘새로운’ 방법들이 전혀 좋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은 결과를 안겨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다름과 새로움을 통해 좋으면서 뛰어나다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덕분에 창의력은 모든 조직이 원하지만 쉽게 잡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면 정말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와 관련해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 준다. 칙센트미하이는 창의성의 구성요소로 ‘개인’, ‘영역’, ‘현장’을 제시하면서, 창의성이라는 것이 형성되려면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개인과 그것을 평가하는 현장 그리고 창의적인 것이 최종적으로 포함되는 영역이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5, 박태준 外, ‘지속발전을 위한 「인적자원확보 국가 시스템」의 혁신–창의성 제고를 중심으로’/ 1996, Csikszentmihalyi, 『Creativity』)
이를 좀 더 풀어서 접근하면 누군가 새로운 것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인정해주고 이를 위한 지원이 있어야 창의성이라는 것이 형성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창의성이라는 특성은 일종의 성향으로, 특정한 집단이나 사회에서 참신한 것이 생산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이 갖추어질 때야 비로소 불특정한 개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창의적인 생각들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5, 박태준 外, '지속발전을 위한 「인적자원확보 국가 시스템」의 혁신–창의성 제고를 중심으로')
결국 한국의 모든 조직이 무척이나 갈구하는 ‘창의성’은 특정한 누군가를 데려온다거나 미친 듯이 직원을 괴롭혀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한 상황과 여건이 마련되어야 가능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조직에서 창의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조직 생활을 경험한 이라면 그리고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기획안이라는 것을 작성해본 사람이라면 알고 있을 것이다. 하나의 기획안이 통과되어 실행되는 것이 얼마나 극적인 일인가를.
경영진의 지시 혹은 담당자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등장한 새로운 기획안들의 상당수가 가지는 가장 큰 난관은 상급자를 설득시키는 것이다. 사실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실현된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영진과 팀장을 설득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획안에게는 핵심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경영진과 팀장을 설득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사실 대박 아이디어일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는 없다. 100개의 아이디어가 튀어나온다면 그중 현실화되는 것의 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제한되는 것, 즉 필터링에 달려 있다. 필터링 자체는 불가결한 것으로 받아들일지라도 어떤 아이디어라도 쉽게 현실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 구성원들에게 공유된다면 필터링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창의적인 그 어떤 것이 이야기되어도 무방한 말 그대로 욕을 먹지 않는 일상적인 환경과 조직문화가 갖추어진다면, 필터링이 아무리 발생하여도 조직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생각들이 등장할 수 있다.

창의성이라는 결과물은 엄청나게 넓은 밭에 수많은 종류의 씨앗을 뿌리고 무작정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성공신화들이 성공 후에 재조명되고 분석되어서 어떠한 요인으로 성공하였다고 비결처럼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진행과정에서 그러한 요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연역적으로 고민되고 활용되었을까? 수많은 조직들의 상급자들과 관리자들은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갓 움튼 창의적인 씨앗들에 대해 기계적인 잣대를 무작정 갖다 대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상급자의 합리성과 관점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답 또한 아니다.

진정으로 조직에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원한다면 조직 내부에 진정한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소통은 일방적으로, 상급자가 말하고 하급자가 듣는 혹은 하급자가 머리를 쥐어 짜내고 상급자가 판단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사실 잘 말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더 어렵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의 조직에 더 많겠지만.
김용원 작가님의 더 많은 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