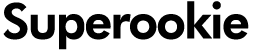오늘 점심 혼자 라면을 끓여먹다 문득 내가 국물은 왼손으로 면은 오른손으로 먹고 있는 걸 보면서, 학창 시절 “두뇌 계발”을 위해 오른손 왼손을 같이 써보려고 노력했던 게 생각이 났다. 어느 책에선가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같이 쓰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걸 보고 오른손 잡이었던 내가 왼손으로 밥을 먹으려고 노력했던 거였다.
머리가 좋아진다면 누가 마다하겠냐만, 아마도 그 당시 난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머리가 더 좋아지길 바랬던 거 같다. 즉, 더 좋아진 머리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공부하기 싫어서였다. 참 난 공부를 뼛속까지 싫어했던 것 같다. 그러나 좋은 학교에는 들어가고 싶었다. 아버지뿐 아니라 삼촌들이 모두 명문대 출신이었던 것이 그 이유였다. 때문에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 만큼만 공부하려 했다. 즉 가능한 적은 시간을 공부하되 가장 나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공부하다 보니 깊게 공부하는 건 무리였다.
지금까지도 이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지 깊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적당히, 즉 효율적으로 일했던 거 같다. 그래서 난 직장 생활하는 동안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회사 생활에 여유가 있었다. 월급쟁이의 자세를 충실히 취하고 있는 셈인데, 최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늘면서 이런 효율적인 태도에 한계를 느꼈다. 발표는 준비한 자료를 그냥 읽는 게 아니다. 발표 자료에 있는 걸 토대로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발표다. 따라서 발표 자료에 있는 것 이상으로 깊게 알고, 인사이트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기만 해서는 곤란하다. 굉장히 많은 자료를 읽고 소화에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수집한 정보 혹은 자료를 알아가는데 급급해 그를 통해 나름대로의 인사이트를 발굴하지는 못했던 거 같다.
이렇게 한계를 느끼고 나니 내 태도를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에 필요한 만큼만 배우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많이 배우려 해야 할 거 같다. 경쟁이 심해서, 혹은 직장 생활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내가 하는 일에서 자기 효능감 혹은 자긍심을 느끼기 위해서다. 좋은 발표를 하고 나면, 그리고 그 발표 내용이 청중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면, 자긍심을 느끼곤 하기 때문이다. 공부는 적게 하고 싶었지만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일도 적게 하면서 좋은 결과물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직장 생활에는 운도 많이 작용하기에 정비례는 아니지만, 인풋과 아웃풋이 어느 정도는 비례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아직도 일을 해야 할 기간이 10년 이상, 어쩌면 20년 넘게 남았다. 그 시간을 나는 더 가치 있게 쓰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