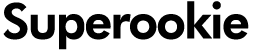국내 대기업에서 내가 발령받은 부서에 출근하는 첫 날을 나는 잊지 못한다.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은 공장 건물 한편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출근했기 때문이다. 건물 곳곳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곳이 보였고, 각종 비닐과 폐기물이 사무실 안에도 있었다. 스산한 11월 어느 날, 난방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임시 사무실에서 내 회사 생활이 시작되었다. 사실 사무실 환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군에서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기도 했고, 공장이란 곳이 그렇게 산뜻한 느낌을 주는 곳은 아니니 말이다. 하지만, 나 역시 '그들 중 하나'가 된 거 같은 느낌이 들어 조금이지만 씁쓸했다.
첫 외국계 기업인 D사에 첫 출근하는 날 역시 잊지 못한다. 인사부를 거쳐 내 자리에 도착하자, 명함부터 각종 사무용품, 그리고 내가 사용할 휴대전화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임원으로 입사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가장 나이가 어린 직원이 입사하는데 이렇게 분에 넘치는 배려를 받게 되자 큰 감동을 받았다. 국내 대기업에서는 받지 못했던 배려를 한꺼번에 받은 거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아마 그때부터 이 회사에서 은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 같다. 물론,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이다.
물론 이 것이 외국계와 국내 대기업 모두를 대변하는 에피소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D사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국내 대기업 L사와는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One of them vs Only You
국내 회사는 나 아니어도 됐다. 나 아니어도 일할 사람이 늘 있었다. 즉, 대체가 쉽다는 이야기다. '우리 회사 들어올 사람 많아~'란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것 같다. 책임감을 느낄 새가 없었다. D사는 달랐다. 나 아니면 안 됐다. 내가 맡은 일은 내가 해야 했다. 내 매니저가 날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일을 대신해 주지 않았다. 늘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는 환경이었다.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나는 회사가 나를 믿는 느낌이 들어 좋았다.
2. 규정이 먼저 vs 예외도 인정
L사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1박 2일 워크숍을 하는데 숙소가 펜션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펜션은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도 있었던 터, 법인 카드로 결제할 수 없었다. 이런 경우 예외를 인정받아 현금을 내고 돌려받아야 마땅하나, 규정상 그럴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야근 택시비를 10번이나 거짓으로 올려 돌려받을 수밖에 없었다. D사에서는 이런 경우 매니저에게 설명하고, 승인받은 후 재무부와 협의하면 큰 문제없이 해결이 됐다. 오히려 매니저와 상의하고 재무부와 협의하는 과정 없이 L사에서처럼 거짓으로 택시비로 올려 처리하다가는 해고당할 수도 있다.
3. 수직적 vs 수평적
그 당시 대기업은 대체로 수직적 문화였다. 지금도 많은 기업이 그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 거 같다. 매니저 혹은 그 위 임원이 이야기하면 '네'하고 하는 그런 문화를 가졌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묵살되는 건 다반사고, 상사를 설득하려면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도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써야 했다. 반면에 D사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가졌다. 매니저라고 언제나 옳지는 않으니 토론도 가능했다. 이런 수직적/수평적 문화를 또 보여주는 게 휴가제도였다. 아직도 많은 기업이 휴가를 매니저가 승인한다. 즉 승인받지 못하면 휴가를 가지 못한다. 하지만 D사는 휴가를 승인하지 않았다. 휴가를 내면 매니저가 거부할 권한은 있으나, 왜 휴가를 가면 안 되는지 직원을 설득해야 한다. 당연히 휴가가 거부되는 일은 거의 없다.
4. 까라면 까 vs 내가 왜요?
국내 대기업에서는 오너 지시로 해야 할 일이 간혹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이유불문이다.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다. 그게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해야 한다. 한 번은 계열사 제품을 판매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물론 형식적으로야 직원에게 장려금을 주면서 지인에게 좋은 회사 제품을 소개하라는 것이지만, 개인별 팀별 실적까지 관리하는데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었다. 당연히 D사에서는 그런 일도 없었지만, 만약 그런 지시가 떨어진다 해도 참여할 직원은 거의 없을 것이다. 타 부서 특판이 나오긴 한다. 그럴 때는 가격이 정말 좋아서 살 사람은 산다. 이때 타 부서 실적에 도움이 돼야 하니 열심히 팔아달라는 등 약간이라도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라도 하면 '내가 왜요?'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5. 늦게까지 열심히 해야지 vs 빨리 일하는 법을 배워
D사에서 같이 일한 첫 매니저는 늘 칼퇴근을 했다. 6시가 되면 짐을 싸, 6시 3분쯤 되면 사무실 문을 나섰다. 그 사람뿐이 아니었다. 아무리 늦어도 6시 30분이 되면 사무실은 거의 텅 비었다. 야근을 한다고 고생한다고 격려해주는 분은 있지만, 장려하지 않는다. 내 매니저는 늘 그랬다. '일이 많으면 빨리 하는 법을 배워'라고 말이다. 반면 국내 대기업에서는 6시가 되어도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눈치 보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6시 반이 넘어가면 저녁 먹으러 가자는 상사의 이야기를 듣고 우르르 일어나 식사를 하고, 돌아와 약간의 식곤증을 달래다 보면 8시, 약간 일하는 척을 하고 9시쯤 되면 슬 팀장부터 일어난다. 눈치 보지 않고 칼퇴근하면 언젠가는 매니저에게 한소리 듣기 일쑤였으니, 다들 눈치 볼 수밖에 없었다. '다들 열심히 일하는데 자네는 왜? 할 일이 없나 보지?'
물론 외국계 회사라고 D사처럼 모두 다 이렇게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대기업 문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생각해 보면 가슴이 살짝 답답해진다. 군대와 똑같기 때문이다. 군대에는 사람이 많다. 20대 초반 청년들을 그리 많이 잡아다 두었으니 남는 게 사람일 거다. 군대만큼 규정을 따지는 조직도, 수직적인 조직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까라면 까야하고, 다 같이 고생하면서 야근해야 하는 게 군대다. 물론 지금은 내가 다녔던 그 회사는 많이 변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의 본질과 관계없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더 이상 (좋은) 사람이 흔하지 않고, 수십 년 전부터 만들어진 규정이 변화가 빠른 지금 시대에는 유효하지도 않으며, 수직적 조직 관리로는 변화하는 시장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까라면 깔 사람도 이제는 없는 데다 일이 많으면 사람을 더 뽑을 일이지 야근을 종용할 일도 아니다.
몇 달 전 그런 기사를 봤다. 국내 제조업 경영자 인터뷰에서 '워라밸만 찾으면 사업보국 같은 경영 이념은 누가 실현하느냐'는 불만도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전형적인 군대 혹은 꼰대 스타일 코멘트다. 대체 직원이 왜 사업보국을 생각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었다. 그런 건 경영자가 할 일이 아닌가? 왜 경영자 자신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가? 진심으로 안타까웠다. 이제는 워라밸을 찾는 직원, 즉 기업 문화가 좋은 회사를 찾는 직원을 탓할 게 아니라 제대로 일하는 문화를 갖추도록 경영진부터 노력해야 한다. 덧붙여 직원으로 일하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회사 문화를 바꿔가야 한다.